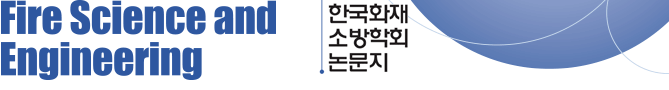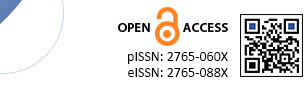1. 서 론
주로 자연 재난이 많이 발생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운송 수단의 발달과 고층 건물의 증가, MERS⋅COVID-19와 같은 전염병의 유행 등 사회 재난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하였다. 재난 발생 위험성 증가와 함께 더불어 다수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변화무쌍하여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인적 피해는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방청에서는 단일 사건에 의해 6∼14명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 다수사상자 발생사고(Incident)로 정의하며, 15명 이상의 환자 발생 시 재난(Disaster)으로 분류하고 있다(1,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6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다중 손상사고로, 10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5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다(3). 보건복지부에서는 동시에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응급의료자원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의료서비스 지원관점에서 사고와 재난을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한다(4).
우리나라는 재난에 대한 재난의료대응기관으로 소방(119), 중앙응급의료센터와 보건소를 규정하고 있다(5).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의료대응기관은 재난상황전파,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6). 일차적 의료체계 대응은 지역 차원에서 ‘재난 응급의료비상대응매뉴얼’에 따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7), 의료대응을 진행하는 보건소 신속대응반(8-10)과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11). 또한, 고양 시외버스종합버스터미날 화재,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충북 제천 스포츠복합건물 화재를 통하여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현장에 DMAT이 출동하여 재난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초기상황전파, 출동기준, 현장응급의료 대응 등에 있어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된바 있다(12-14). 하지만, 재난 현장의 지리적 특성이나 날씨, 주변 환경 요소에 따라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DMAT이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난 발생 직후 발생하는 다수사상자에 대해 신속한 환자 분류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방 119상황실로부터 출동지령을 받고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구급대는 환자의 현장응급처치부터 병원이송완료까지 병원전단계를 담당하므로 재난의료대응기관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15-17)을 하게 된다.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자력탈출 한 환자를 담당하게 되고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선착구급대의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전개되는 재난의료 대응 단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운영과 같은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임시현장응급의료소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급대원들의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및 중증도 분류체계 인식과 관련 교육 횟수, 현장 경험 등을 살펴봄으로써 임시현장응급의료소의 효율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장응급의료소 가동 전(前) 단계에서 선착구급대원의 역할을 제시하여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구급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와 인명피해 파악, 중증도 분류 및 사고 현장 상황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본 론
2.1 연구 설계
2.1.1 연구목적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현장에서 선착구급대의 임시현장응급의료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구급대원의 재난대응 역량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1) 구급대원들의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현장 출동 경험 횟수는 어느 정도인가?
2) 구급대원들의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현장에서 선착구급대로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용과 중증도 분류 횟수는 어느 정도인가?
3) 구급대원들의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방법 인식도는 어느 정도인가?
4) 구급대원들의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전문교육 필요성은 어느 정도인가?
5) 구급대원들의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 재난 대응 의료체계 인식도는 어느 정도인가?
6) 구급대원들의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 임시응급의료소에 대한 인식도는 어느 정도인가?
2.1.2 연구대상
울산시 소방본부 119 상황실 구급의료지도 의사 및 산하 5개 소방서의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6월 2일부터 2020년 6월 25일까지 약 23일 동안 무작위로 서면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울산시 소방본부 담당자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소방서별 센터 구급대에 방문하여 구급대원들에게 연구 목적과 설문지에 대한 설명 후 설문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에게만 시행하였다. 245명이 설문에 유효한 응답을 하였으며(서면 설문지 153부, 온라인 설문지 92부), 무성의하거나 불성실한 응답 10부를 제외한 235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연구 결과
2.2.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표본은 총 235명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 204명(86.8%), 여자 31명(13.2%)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다. 연령의 경우 30-39세 135명(57.5%), 40-49세 54명(22.9%), 20-29세 41명(17.5%), 50대 이상 5명(2.1%) 순으로 나타났다. 계급의 경우 소방사 85명(36.1%), 소방교 83명(35.3%), 소방장 55명(23.8%), 소방위 11명(4.6%), 소방사가 가장 많았다. 소방근무 연수의 경우 3년 미만 95명(40.4%), 10년 이상 48명(20.4%), 7년 이상-10년 미만 37명(15.8%), 3년 이상-5년 미만 34명(14.5%), 5년 이상-7년 미만 21명(8.9%)으로 순으로 3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직위의 경우 1급 응급구조사 114명(48.5%), 간호사 107명(45.5%), 2급 응급구조사 9명(3.8%), 의사 4명(1.7%), 기본 구급교육 이수자 1명(0.4%)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2.2.2 구급대원들의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현장 출동 경험 횟수 분석
구급대원들의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현장 출동 경험 횟수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2회’가 100명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5회 미만’ 56명(23.8%), ‘없다’ 52명(22.1%), ‘10회 이상’ 15명(6.4%), ‘5-10회 미만’ 12명(5.1%) 순으로 나타났다.
2.2.3 구급대원들의 선착구급대로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용과 중증도 분류 횟수
구급대원들의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현장에서 선착구급대로 임시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 운영한 횟수와 중증도 분류 횟수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임시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 운영한 횟수는 ‘없다’가 161명 (6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회’ 58명(24.7%), ‘3-5회 미만’ 12명(5.1%), ‘5-10회’ 4명(1.7%) 순으로 나타났다. 중증도 분류를 해본 횟수는 ‘없다’가 169명 (7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회’ 53명(22.6%), ‘3-5회 미만’ 9명(3.8%), ‘5-10회’ 4명(1.7%) 순으로 나타났다.
2.2.4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방법 인식도 분석
구급대원들의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방법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t, F 검정을 시행한 결과 Table 4와 같다. 근무 연수에 따른(F = 3.455, p < .01) 중증도 분류 방법 인식도와 직위에 따른(F = 3.955, p < .01) 중증도 분류 방법 인식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4
Analysis of the Awareness of Tri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amedics
| Category | N | M | S.D | t/F | p | |
|---|---|---|---|---|---|---|
| Rank | Firefighter | 85 | 3.44 | .715 | 2.650 | .050 |
| Senior firefighter | 83 | 3.54 | .738 | |||
| Fire sergeant | 56 | 3.70 | .784 | |||
| Fire lieutenant | 11 | 4.00 | 1.000 | |||
| Work career | ~< 3 years | 95 | 3.43 | .724 | 3.455** | .009 |
| 3~< 5 years | 34 | 3.38 | .697 | |||
| 5~< 7 years | 21 | 3.48 | .750 | |||
| 7~< 10 years | 37 | 3.78 | .630 | |||
| 10 years ≤ | 48 | 3.81 | .891 | |||
| Gender | Male | 204 | 3.57 | .743 | .357 | .722 |
| Female | 31 | 3.52 | .890 | |||
| Age | 20∼29 | 41 | 3.39 | .771 | 1.994 | .116 |
| 30∼39 | 135 | 3.53 | .721 | |||
| 40∼49 | 54 | 3.76 | .799 | |||
| 50∼59 | 5 | 3.60 | 1.140 | |||
| Assigned work | Doctor | 4 | 4.00 | .816 | 3.955** | .004 |
| Nurse | 107 | 3.36 | .719 | |||
| 1st EMT | 114 | 3.74 | .753 | |||
| 2nd EMT | 9 | 3.44 | .882 | |||
| Basic first aid education trainee | 1 | 4.00 | . | |||
2.2.5 일반적인 사항에 중증도 분류 전문교육 필요성 분석
구급대원들의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전문교육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t, F 검정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일반적인 사항에 따라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5
Analysis of the Needs of Professional Education of Triage
2.2.6.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 재난 대응 의료체계 인식도 분석
구급대원들의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 재난 대응 의료체계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t, F 검정을 시행한 결과 Table 6과 같다. 재난 대응 의료체계에 대한 인식은 계급(F = 5.299, p < .01), 근무 년 수(F = 5.575, p < .001), 나이(F = 3.420, p < .05) 직위 (F = 3.114, p < .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6
Analysis of the Awareness of Medical Systems in Response to Disasters
사후검증 결과 계급에서는 소방사(2.80 ± .655)보다 소방장(3.33 ± .904)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F = 5.299 p = .002), 근무 년 수에서는 3년 미만(2.77 ± .663)보다 10년 이상(3.36 ± .987)이 더 높게 나타났다(F = 5.575 p = .000), 나이에서는 20대(2.80 ± .758) 보다 40대(3.30 ± .952)가 더 높게 나타났다(F = 3.420 p = .018).
2.2.7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 임시현장응급의료소에 대한 인식도 분석
구급대원들의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 임시현장응급의료소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t, F 검정을 시행한 결과 Table 7과 같다. 일반적인 사항에 따라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7
Analysis of Awareness of Temporary Emergency Medical Centers
3. 결 론
3.1 연구결과 고찰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여 대응하는 선착구급대의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운영 결과는 향후 전개되는 재난의료 대응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급대원의 임시현장응급의료소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여 실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구급대원들의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현장 출동경험은 77.9%로 나타났지만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은 31.5%, 중증도 분류 경험은 28.1%로 나타났다. 환자의 중증도 분류, 현장응급처치 및 분산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로서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전의 연구(15-17)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구급대원들은 중증도 분류체계와 관련한 전문교육을 받지 않아 중증도 분류를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79.1%로 높았다. ‘119소방과 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 131명을 대상으로 한 Yoon(18)의 연구결과에서 52.4%가 중증도 분류에 대하여 모르고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여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결과 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적 차이와 설문 대상자의 수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중증도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구급대원이라 할지라도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는 잘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18)에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재난현장에서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당황하게 되어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반복적인 현장모의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실제 다수상자 발생 재난 현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구급대원은 대형 재난발생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평소에 교육 받은 지식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착구급대의 효율적인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위하여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이 병행된 다양한 전문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많은 구급대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운영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각 소방서 별 현장대응단에 구급대응팀을 신설해야하며, 현장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다수사상자 대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5)가 발표되었다. 특히,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현장에서 정확성(18,19)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증도 분류방법(20,21)으로 SALT (Sort, Assess, Lifesaving Interventions, Treatment, and Transportation) 교육을 강화(4,22)하는 것이 구급대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연구(18)도 발표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소방장 이상, 10년 넘게 근무한 40대 이상의 구급대원에서 재난대응의료체계 및 임시현장응급의료소에 대한 인식도가 높고 중증도 분류 경험도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현장에 대한 많은 경험에서 온 실제 목소리라 판단된다. 선착구급대의 임시응급의료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현장 출동 경험이 많은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임시현장응급의료소의 책임자로 양성하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DMAT 가동 전(前) 현장에서 응급처치, 중증도 분류를 비롯하여 원활한 인수인계 및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앙과 지역의 DMAT 구성원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의 국가ㆍ지역ㆍ특수상황에서 발동되는 3가지의 DMAT(23)으로 운영하는 것과 일본의 국가와 지역병원 기반으로 운영되는 2가지의 DMAT(24)으로 운영하는 것과 유사하다. 다수사상자 재난 발생 시 각 지역의 구급대원 중 DMAT 경험을 가진 구급대원을 미리 파악하여 임시현장응급의료소에 출동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DMAT 경험을 가진 구급대원에 대한 정보를 119 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 보건소에서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화재사고, 고양 시외버스 종합터미날 화재, 2018년 충북 제천 스포츠 복합건물 화재의 경우 현장에서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 중증도 분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주체를 선착구급대가 맡기에는 역부족이라 논하기 전에 재난 상황을 접수하고 10 min∼30 min 이내 가장 먼저 재난 발생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선착구급대가 임시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하도록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법령’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구급대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활성화하여 지식과 대응과정을 제공하여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현장에서 정확한 중증도 분류가 시행되는 임시현장응급의료소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3.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하여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현장에서 임시현장응급의료소에 대한 인식과 운영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대안을 제시한 점에 의의를 두며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대한민국 전체로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의 필요성 및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향후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운영 경험을 가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소방구급대원 구성원 중 소방위이하의 계급에서 5개 소방서 기관을 대상으로 제한되어 연구가 진행된 점이 미흡하였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소방의 모든 기관, 모든 계급 대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형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지법과 설문지를 통한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데이터를 얻었다. 일부 구성원들의 설문참여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문제와 응답의 진실성, 관련변수 등 질적인 면을 고려치 못한 것이 미흡하였다.